소하리 3통 3반
나는 그닥 밖에 나가 노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래도 벼 베기 끝난 꽁꽁 언 논에서 나무 썰매를 지치던 기억은 있다. 얼음 위로 삐져나온 포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운전을 잘 해야 했다. 따뜻한 아랫목, 두꺼운 이불의 미련한 추억, 군고구마 향이 기억난다. 그 많은 썰매들은 다 누가 만들어 주었을까.
우리 가족은 광명시 소하리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러 지방에서 상경한 수많은 타지인 가족의 하나였다.
마을 초입에 ‘내가 학교로 간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2차선 시멘트 도로가 있었다. 마을 초입 오른쪽은 언덕 밑부터 언덕 위까지 기아 자동차 회사의 사원 사옥으로 이뤄져 있었다. 왼쪽은 황토 흙벽에 기와나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마을로 토박이 주민들이 살았다. 면사무소를 사이로, 1975년생인 내 기억 속의 그 마을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 있었다.
오빠는 부모님의 고향 충청남도에서 포대기에 업혀 올라와 그곳에서 자랐고, 나는 그곳 토박이 어르신들의 마을, 그 중에서도 소하리 3통 3반. 그곳에서 태어났다. 실은 ‘소하리’는 일제시대 토지 조사를 깡그리 끝낸 후 붙여진 이름일 뿐, 원래 그 마을 이름은 따로 있다. 사람들이 입구에 세워져 있던 일본 신사를 허물고 되찾은 이름은 바로 [설월리雪月里]. 지금, 아니 오늘 이 시각도 개발을 하고 있는 광명의 ‘거의 마지막’ 남은 자연마을이다.
요즘은 자녀의 학군을 따라 이사하지만, 당시는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이사하던 시절. 나는 1975년부터 만 8년이라는,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머금은 그저 한 아이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올라 간 첫 날, 교장실의 마룻바닥의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아버지 직장을 좇아 서울로 이주했었다. 물론 어찌된 영문인지, 무슨 인연인지, 어른이 된 후 설월리 근동에 돌아와 가정을 일구어 살고 있다.
소하리나 설월리라고 말을 꺼내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차라리
“서면 초등학교 건너편 동네 있잖아요, 거기서 났어요” 하면,
“아, 그럼 토백이인감요?” 하고 알아준다.
태어난 곳은 물론, 광명 지역 전체가 너무나 많이 변했다.
예전에 ‘리’로 불렸던 곳은 모두 ‘동’이 되었다. 지금 지하철이 들어선 철산동 상업지구도 그때는 그저 철산리였다. 논, 밭, 들, 개구리 잡던 천지는 빼곡히 아파트촌이다. 나 역시 아파트에 산다.
설월리는 재개발의 불이 당겨진지 매우 오래. 나는 어제 일요일, 광명시 하안도서관에서 출발하여 설월리 나의 고향 마을을 둘러보고 왔다. 아! 누구 말마따마 “시처럼 살다가 소설처럼 죽고 싶다!”였는데, 정말 내가 나의 고향이 사라지는 광경을 이 눈으로 보게 되다니.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얽혔다. 설월리 재개발은 이미 2016~2017년도에 청사진이 나왔다. 나는 우연히 그 청사진을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보았다.
그런 걸 보지 말았어야 했다. 모니터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이 났다. 그리고 한동안 몹시 아팠다.
설월리 재개발은 이미 불이 당겨졌다. 시작된 이상, 끝마름을 누가 해 줄지 모른다! 과연 누가 자연마을에 신경을 쓸 것인가. 광명을 서울처럼 만들겠다는데!
고향 집의 흙 벽, 기와는 모두 헐릴 것이다.
집 앞 텃밭의 감나무는? 감나무 걱정은 무슨, 감나무는 이미 말라 죽었다.
주인댁 언니 방 처마 밑에 널빤지 받쳐준 제비집은? 논이 없어지면서 제비들은 광명을 떠났다.
나는 아무도 이해 못하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 신음하였다. 청사진을 본 그 이후 나는 다른 일과 맞물려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심한 날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 링거를 맞아야 할 정도였다. 가까스로 일어나기까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태어난 마을에 대한 애정이 나도 몰래 너무나 깊었던 탓이리라.
그곳을 떠올리면 나는 어디에서건, 푸른 안개 속에 휩싸일 수 있다.
나무들, 숲들, 억센 들풀 혹은 부드러운 꼬마 풀들.
누가 장난을 쳐 놓은 풀 묶음 함정들.
어른들이 심어 놓은 호박 덩굴. 꿀벌이 들어갔을 때 꽃을 여며서 가두는 재미가 있었다.
코스모스!
논두렁에 밟히던 질경이와 냉이가 떠오른다.
토끼풀이 지천인 들과 산길이 떠오른다.
어머니께 의지해 산속을 헤매다 샘물을 발견하고,
할미꽃이 피어난 개수를 세어가며 집에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엔 비 온 후 넓은 창을 열었을 때, 쌍무지개가 떠 있었다. 창은 멋진 그림이 밝혀진 액자가 되었다. 등화관재 훈련 때는 반딧불이 집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등화관재로 온 집안 불을 끈 내내 반딧불을 분유 깡통에 넣고 어머니와 함께 녀석을 어르며 놀았다.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누구에게 안 그렇겠는가. 삶 전체를 동화처럼 살기엔, 사람의 수명은 예상보다 너무나 길지 않은가. 그러나 그때마다 뱃속에 막 떠 넣은 두둑한 흰밥의 뜨심 같은 그 땅, 그 마을, 그 사람들의 기억이 나를 받쳐 주었다.
그렇다.
그 땅은 내 삶에 있어 나만이 지녔던 치유 샘물이었던 게다. 다른 식구들은 몰라도, 나의 친정어머니와 나에겐 묘하게도 설월리 마을만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은, 살고 싶은, 연어의 회귀본능 같은 게 있었다.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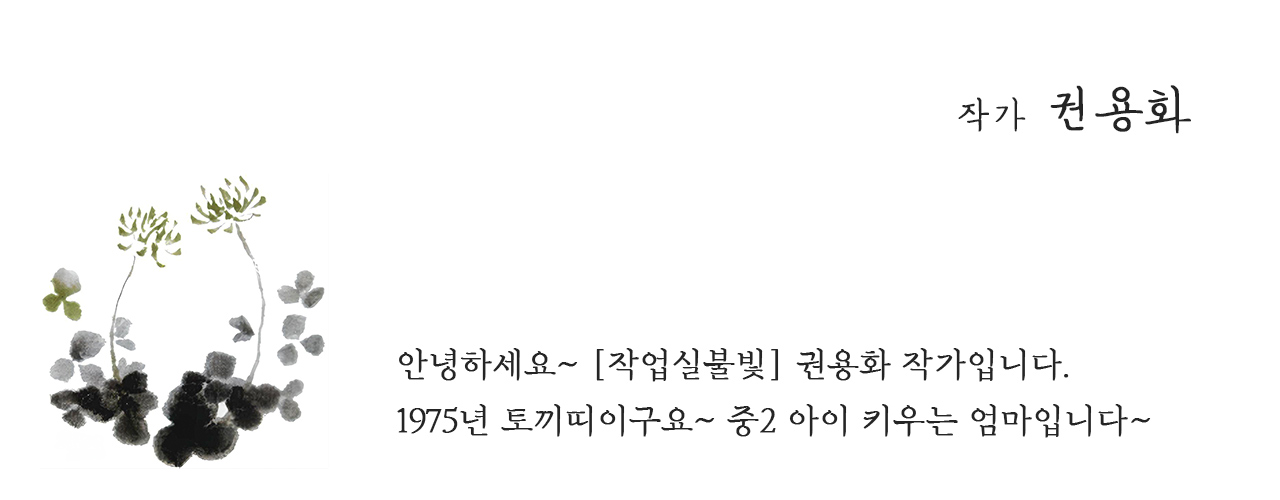

1) “왜 너는 니 고향 광명 자연마을 설월리가 헐리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니?”라는 동기의 말에 ‘욱’하여 광명시민신문www.kmtimes.net 글쓰기 업業에 2021년 발을 들였다. 돌아보니 세상사가 그렇다. 여기, 누구나 종이를 꺼내어 ‘농’이라 써보자. 뒤집으면 ‘욱’자가 된다. 동기는 그저 ‘농(담)’이었겠으나 나는 그만 ‘욱(함)’하여 각오를 하고 말았다.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께서 언제나 “집 잘 보고 있어~”하셨으니, 정말루 ‘그 집을 지켜 보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 왔다.
2) 2024년 11월 22일(양력) 금요일은 음력으로 소설小雪이었다. 야쿠르트 여사님이 그러신다. “눈이 오실 날씨데 비가 오시네. 중간에 다 녹는가보다.”
3) 예전에 2005년 경 관악산 자락서울대학교에 갔다가 문학 동아리가 내건 현수막에 꽂힌 바 있다.
“아! 시처럼 살다가 소설처럼 죽고 싶다.”
4) 11월 24일(日) 내가 태어난 댁 장손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다. 설월리의 그 집. 나의 유년을 금빛, 무지개빛으로 물들여줬던 설월리 그 집이 무사히 좋은 터에 이전 결정 된 사실을.
내가 태어난 문간방, 오빠와 뛰놀던 아래채집... 나의 젊은 어머니가 서 계신 것만 같은 그 집이 헐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나는 희망이 생겼다. 재개발 난리통에도 제발 한 집이라도 더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금강정사까지 올라가도 보고 수없이 눈물을 흘려 보았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기형도의 시 <빈집> 중에서)가 아니라, 지금 설월리는 “가엾은 내 고향 황포에 갇혔네”이다.
5) “태어난 흙집이 남아있다니 참 좋겠소! 내 고향 마을은 싹 헐리고 없다오!”
-2023년 서면초등학교에서 출발한 하교길을 기억해서 내가 태어난 흙집을 찾았으나 처음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길 가는 나그네 할아버지께 묻자, 헐헐거리며 남기신 말씀이다.

